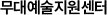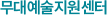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악기소개
- 단체소개
- 악기소개

아쟁
슬프고도 나직한 소리, 아쟁- 『악학궤범』 중 ‘고려사’에서는 아쟁을 당악기(唐樂器)이며 7줄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듯 아쟁은 당악에만 쓰이다가 조선 성종 무렵에는 향악에까지 쓰이게 되었다.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 당나라 때에 ‘알쟁’ 또는 ‘쟁이’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대나무의 끝을 매끄럽게 하여 그것으로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냈다고 한다. 아쟁은 이를 받아들인 듯이 보이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들어 왔다고 한다.
저음 현악기로 소리의 지속성이 뛰어나
아쟁은 전면이 오동나무이고, 후면은 밤나무이며, 상자 식으로 짜서 만드는데, 몸통이 가야금보다 크고 두껍게 짜인다. 거문고와 비슷하게 운두(雲頭, 악기의 머리 부분)가 얇고, 길이는 151.25㎝, 너비는 24.24㎝이다. 꼬리 부분(부들)이 아래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야금의 줄보다 굵은 일곱 개의 줄은 모두 기러기 발 모양의 안족(雁足) 위에 올려져 있다.
바깥쪽의 줄이 가장 굵어 낮은 소리가 나고, 안쪽으로 가면서 줄이 가늘어지고 그 음이 높아진다. 각 줄에서 낼 수 있는 음의 높이는 연주되는 악곡에 따라 안족을 움직여 조율할 수 있다.
아쟁은 국악기 중에서 유일한 저음 현악기(서양악기로는 베이스(bass)라 할 수 있다)로, 소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해금과 더불어 관악합주에 반드시 포함된다. 궁중음악(관현악)에서는 무용 반주에 쓰이는 삼현육각의 편성을 제외한 어느 형태의 합주곡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풍류나 가곡과 같은 민간음악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
마찰시켜 소리 내는 찰현악기
자연주를 할 때 자세는 다음과 같다. 구부러진 꼬리 부분은 바닥에 놓고, 머리 부분은 초상(草床)이라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이렇게 되면 악기가 고정되어 안정감이 생긴다)경사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오른손에 개나리나무로 만든 활대를 잡고 줄을 마찰시켜 소리를 낸다.
그래서 해금과 더불어 찰현악기(擦絃樂器)로 분류된다. 활대는 개나리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것으로, 송진을 칠하는데, 그 이유는 활대와 줄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말총이 아닌 개나리나무로 굵은 줄을 마찰시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리가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나 그 점이 아쟁의 특징이기도 하다. 주로 정악을 연주할 때 나무활대를 사용하고, 산조를 할 때에는 주로 말 꼬리로 된 말총활대를 사용한다. 창작곡을 연주할 때에는 바이올린의 활대를 사용하며, 낚시 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창작곡에서는 악보로 오선보를 많이 사용하며, 궁중음악은 12율명(律名)으로 되어 있는 정간보를 본다. 정간보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선보로 옮겨서 보는 경우도 있다.
산조의 성숙과 더불어 태어난 신조아쟁
아쟁산조는 산조가 20세기 이후 여러 악기들에 실려 활발하게 성숙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었다. 즉 1940년대에 이르러 전통음악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아쟁 실기인들의 예술 정신에서 탄생된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산조를 연주하는 아쟁, 즉 산조아쟁(소아쟁)은 일제 때 유명했던 박성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연예대감』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문헌에도 산조아쟁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1987년에 발간된 『산조연구』에 소개된 바 있고, 그 후 1989년 『뿌리깊은 나무 산조전집』에 소개되었다. 그런데 산조아쟁이 개량된 과정에 대하여 기존의 문헌들은 전래 악기인 대아쟁을 곧바로 산조아쟁으로 개량하여 사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보다는, 산조를 연주할 수 있는 가야금으로부터의 영향과 활대를 사용하여 지속음의 효과를 내고 있는 전래 아쟁(대아쟁)의 영향을 함께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가야금과 대아쟁의 이중적 개량 형태로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조아쟁은 무용이나 창극 반주 음악에서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하는 데서 그 태생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아쟁의 사용과 함께 반주음악은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사용할 때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따라서 아쟁의 사용이 보편화된 것이다. 그 후 1950년을 전후한 시기는 창극의 쇠퇴기여서 반주음악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또 다른 아쟁의 가능성을 향해 발전된 음악이 곧 정제된 틀을 갖춘 아쟁산조이며, 아쟁산조를 연주하게 됨으로써 소아쟁이라 불렸던 악기는 산조아쟁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개량아쟁의 음역과 조율법
정악아쟁
10현 대아쟁
관현악에서 가장 낮은 음역을 담당한다. 합주를 할 때 아쟁의 유무에 따라 장엄함과 정중함이 살아나느냐 아니냐하는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으로는 우아하고 서정적인 분위기, 또는 차분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줄과 줄 사이가 넓기 때문에 자유로운 손놀림이 어려워 빠른 곡은 힘이 들지만, 중후한 음역은 아쟁만의 자랑이다.
10현 중아쟁
10현 중아쟁
산조아쟁을 개량한 것으로, 줄과 줄 사이가 넓고, 또 줄이 두꺼워서 산조아쟁과 같이 꺾는 음, 떠는 음들을 계면조로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주로 창작곡을 연주할 때 사용하며, 튀는 음색이기 때문에 조금만 세게, 또는 여리게 연주되면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 그래서 소아쟁 못지않게 연주자의 공력을 요한다.
산조아쟁
산조아쟁
산조아쟁은 궁중음악보다 가락이 많고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산조아쟁(소아쟁)은 줄과 줄 사이가 좁고 전체적인 음역도 높으며, 줄의 굵기도 정악아쟁보다 가늘고 악기 길이도 짧다. 또 개나리활대를 쓰는 것은 정악이나 산조나 같으나, 활대의 굵기와 길이는 산조아쟁의 활대가 더 짧고 가늘다.
산조아쟁의 창시자인 한일섭(1929~1973)류 가락을 바탕으로 한 산조아쟁으로는 박종선류, 윤윤석류가 있는데, 연주 시간은 짧은 산조가 25분, 긴 산조가 1시간 정도 된다. 한일섭류와 비슷한 시기에 생긴 정철호류는 서용석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장월중선 선생의 가락을 바탕으로 해서 짜여진 산조아쟁은 김일구류로 많은 제자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남도지방의 무속음악이나 시나위에도 쓰이는 산조아쟁은 창극이나 무용의 반주, 민요 반주 등에서, 그리고 방송국의 효과음악에서 애절한 분위기를 낼 때 그 특유의 음색을 발휘하고 있다. 요즘에는 아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작음악 등 여러 곡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쟁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D로 즐기는 아쟁의 향기
93일요 명인 명창전 6 -박종선 아쟁산조 (서울음반)
93일요 명인 명창전 6 -박종선 아쟁산조 (서울음반) 아쟁의 명인으로, 현재 국립창극단에서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박종선 명인이 1993년 12월 국립국악원에서 가진 공연실황을 담은 음반. 박종선류 아쟁산조, 아쟁·거문고 병주, 아쟁·대금 병주 등 5곡을 수록하고 있다. 박종선 명인은 아쟁산조의 창시자인 한일섭을 사사했는데, 서용석과 김일구가 그러하듯 스승에게 배운 가락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가락을 삽입시켜가며 선율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박종선류 아쟁산조가 갖는 매력은 진한 한의 정서를 잘 농축시켜 담아낸 데 있으며, 진계면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김일구(삼성뮤직)
김일구(삼성뮤직) 아쟁산조와 아쟁독주를 수록하고 있다. 아쟁산조는 김일구가 장월중선에게 배운 가락에 자신의 가락을 보태어 규모도 크게 하고 전체적인 짜임새도 밀도 있게 재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김일구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의 것보다 15분 정도 길다. 희로애락이 분명하며 계면보다는 우조가 많고, 여느 산조와 같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짜여져 있다. 연주자가 판소리 명창이라 산조 가락 역시 거의 판소리 가락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래서 다른 류보다 어려우며, 가락 또한 많아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이다.